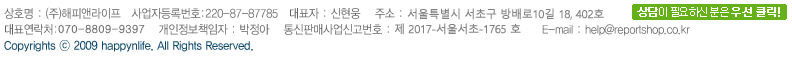교회에서 문화센터까지
1. 문화, 종교, 그리고 철학
종교는 우리 사회와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는데, 역설적이게도 종교를 둘러싼 담론은 사적 영역으로 추방되어버렸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더욱더 종교에 대한 철학 쪽의 대응이 요청된다. 문화라는 말마디를 정의하긴 어렵지만 넓은 의미의 문화에는 당연히 종교도 포함된다. 이런 의미에서 ‘종교문화’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서양 문화의 밑바닥에는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씨줄과 날줄로서 ‘기독교적 전통(hebraism)’과 ‘그리스적 전통(hellenism)’ 을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종교를 철학적으로 문제 삼는 분과를 ‘종교철학’이라고 부른다. 종교학은 종교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일종의 경험과학이다. 반면에 종교철학은 종교현상을 철학적으로 비판한다. 철학은 어떠한 비판 면제 영역도 용인하지 않는다. 종교와 철학, 신앙과 이성은 한편으로는 상호 보완적이다. 기독교의 교리는 그리스철학으로부터 압도적인 영향을 받아 확립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로 시작되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 철학의 흔적이 발견된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그리스 말로는 ‘로고스’로 그리스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런가 하면 흔히 교부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의 기독교화요, 스콜라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기독교화라고 말한다.
그러나 종교와 철학, 신앙과 이성은 다른 한편으로는 적대적이기도 하다. 테르툴리아누스(Tertullianus)는 기독교철학으로 기독교적인 것을 말하는 모든 시도에 극력 반대했는데, 아테네와 예루살렘, 아카데미아와 교회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보았다. 신앙과 이성은 오래도록 서로 가까이 할 수 없었는데, 이성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신앙주의(fideism)와 신앙을 거부하는 독단적 이성주의(rationalism)가 바로 그것이다.
종교는 re-ligare, 즉 ‘다시 잇는다 혹은 결합한다’라는 견해가 널리 받아들여져 종교를 ‘신앙에 의한 신과 인간의 결합’이라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원 풀이는 실상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이 세상의 대단히 많은 종류의 종교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르며 정의가 무수히 많고 정의들의 진폭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종교가 무엇인가란 물음에 답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2. 종교의 출발점으로서의 인간의 유한성
고대신화에 ‘걱정(불안, 근심)’ 이라는 이름의 신이 있었다. 이 신은 인간을 만들고자 땅을 차지하고 있는 신과 영혼을 관장하는 신을 찾아갔다. 흙으로 만든 인간에게 영혼을 불어넣자, 처음에 대단치 않게 여긴 신들은 인간이 완성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세 신 모두 이 인간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것이다. 저마다 인간을 소유하겠다고 다투었고, 재판관에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청했다. 그 판결이 곧 인간의 운명이 되었다. “이 인간이 죽으면 흙을 빌려 준 신은 그 육체를 되돌려 받고, 영혼을 빌려준 신은 그 영혼을 도로 차지하라. 그러나 이 인간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걱정(불안, 근심)’의 신이 소유하라.”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별문제이나 살아 있는 동안은 걱정의 노예가 된다는 이야기다.
실로 인간은 온갖 번민으로 얼룩진 존재이며, 누구나 이러한 번민으로부터 해방되기를 간절히 원하다. 예수가 “나에게로 와서 안식을 얻으라.” 라고 말한 것은 그 뜻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실로 복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따지고 보면 온갖 번민은 인간의 유한성에서 온다. 그리고 그 절정이 바로 죽음이다. 서양 공동묘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묘비명 가운데 하나는 "Hodie mihi, cras tibi" 라는 라틴어다. “오늘은 나의 차례, 내일은 너의 차례” 라는 말이다. 공동묘지에 방문한 산 사람에게 죽은 자가 주는 충고인 것이다. 또, 집 거실에 놓는 괘종시계에 “Memento mori.”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기도 하다. ‘그대가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뜻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쳐다보게 되는 괘종시계에 이 말을 새겨둠으로써 서양 사람들은 인간의 유한성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 정확한 날짜를 모를 따름이다. 흔히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루하루 죽어간다고 말해야 옳지 않은가? 시간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그 종착역으로 내몬다. 하지만 인간은 그거에 내몰리지도 않고 변화나 소멸을 겪지도 않으며 한결같이 존재하는 영역을 꿈꾸어왔다. 이처럼 유하한 존재인 인간은 절대적 가치를 종교에서 찾는다. 종교의 세계는 이성만으로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세계요, 오직 자아를 완전히 절대자에 귀의시키는 신앙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세계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바로 이 점에서 인간은 ‘종교적 동물(homo religiosus)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신’은 존재하는가?
불교를 제외한 각각의 종교들은 초월적인 존재자, 즉 신을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문제가 되는 것을 시각이나 촉각 등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든 경험하게 하는 것인데 신의 경험이나 계시와 기적에 의존해서 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신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철학자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논증하려고 시도해왔다.
이 때,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논증한다는 것은 신왕과 이성의 만남을 뜻한다. 그리고 서양의 전통에서 신의 존재를 합리적으로 논증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의 논증에는 ‘존재론적 논증’,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분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