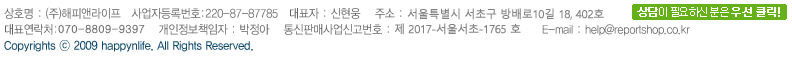글쓰기와 대학생활 문장여화文章如畵-흰 바람벽이 있어
오늘도 별 일 없는 하루였다. 어제와 똑같은 시각에 집을 나서 어제와 똑같은 일터에 나가 어제와 똑같은 사람들과 일했다. 몸을 쓰는 일은 언제나 늘 그랬듯 고되고 혹독했다. 그래도 얼마 전까진 날이 선선해서 일하기 딱 좋은 날씨였는데, 요즈음은 점점 겨울로 접어드는 건지 부쩍 찬바람이 불어 일하다보면 콧날이 시큰거리고 볼이 얼얼했다. 벌써 날이 이렇게 추워지면 한겨울엔 얼마나 추울지 왈칵 걱정이 들었다.
같이 일하는 김씨가 고향에 있는 가족 이야기를 했다. 어제 아내가 보낸 편지가 왔다고 했다. 집을 떠날 적에는 임신 중이던 아내가 어느새 예쁜 딸아이를 낳았단다. 이제는 막 벽을 잡고 일어나려고 애쓰는 단계란다. 첫째와는 달리 울음이 적어 키우기 훨씬 쉽다고 했다. 참, 그리고 아이 이름은 그가 집을 떠나오며 지어준 이름으로 했단다. 아이도 그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그 이름을 불러주면 연신 방긋방긋 웃는다고 했다. 그 얘기를 내게 전해주는 김씨도 아이처럼 연신 벙글벙글 웃고 있었다.
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간간히 맞장구만 대충 쳐 줬다. 남의 가족 얘기에는 별 관심이 없다. 아이 자랑은 더더욱 그렇다. 아이를 키우고 싶지도 않고 예뻐하지도 않아서 그런가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언제나 고요하다. 인적 하나 없는 어둑한 길을, 짐승과 풀벌레 소리를 벗 삼아 홀로 터덜터덜 걷는다. 오늘따라 유난히 달이 휘영청 밝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찬 기운이 확 덮친다. 손을 더듬거려 15촉 전등을 겨우 켜자 몇 번 깜빡거리더니 이내 희미한 빛을 낸다. 15와트짜리가 밝아봐야 얼마나 밝겠느냐마는 방이 좁아 그런지 그럭저럭 살만은 하다. 벽 한 켠에 걸려 있는 때 묻은 낡은 무명셔츠는 집을 떠날 때 늙은 어미가 하나뿐인 외아들 돈 벌러 타지까지 가서 고생한다며 눈물 훔치며 사 주신 것이다. 그것만 보면 고향의 어머니가 떠올라 어쩐지 마음이 묵직해진다.
아, 따듯한 감주나 한잔 했으면. 달디단 감주 한잔만 딱 먹으면 좋으련만, 하는 생각을 하며 흰 벽에 아롱아롱 비치는 전등빛을 멍하니 보는데.
왜일까.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흰 바람벽에 비쳐 보이는 것은. 좁은 마당에서, 오늘 밤처럼 추운 날 무이며 배추며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씻고 있는 나의 늙은 어머니. 쪼글쪼글 주름진 손이 잔뜩 얼어 빨갛게 얼어 있다. 가난하고 늙은 어미가 혼자 살고 있는 고향집 장롱 깊숙이에는 타지에 있는 외아들이 가끔 보내오는 편지가 차곡차곡 쌓여있다. 별 내용도 없이 간단히 안부나 물어보는 짧은 편지인데도 이제 삶의 낙이 아들뿐인 어미에게는 보물과도 같은 존재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내 돈 많이 벌어서 금방 돌아오께, 하는 아들의 기약 없는 약속을 어미는 아직까지도 철석같이 믿고 있다.
한 아낙네의 모습도 비친다. 여인은 긴 머리를 하나로 단정하게 쪽지고 보글보글 대구국을 끓인다. 작은 상을 하나 펴자 지아비가 천천히 걸어온다. 여인은 열심히 끓인 담백한 대구국을 상 위에 올리고, 단촐하게 이것저것 잔반을 차리고, 지아비의 맞은편에 앉는다. 저녁시간인 것을 알고 마당에서 실컷 뛰어 놀던 작은 사내아이가 뛰어 들어온다. 여인은 아이를 제 옆에 끼고 찬찬히 젓가락을 든다.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띄워진다. 혼인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했었는데. 바람대로 여인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란 말이냐, 그렇게 애써 스스로를 위안하고 달랜다.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게 있다는 것을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맑은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 마음이 전부는 아니더라. 차마 다가갈 형편도 되지 못해 조금만 더 벌고, 조금만 더 준비되면 다가가리라 마음먹고 있는 도중에 여인은 다른 이와 훌쩍 혼인해 버렸다. 뭐 어떻게 잘해보려던 욕심을 가졌던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 그녀와 말 한마디 섞지 못했었는데. 그저 멀리서, 등 뒤에서 혼자 바라보고 마음 설레어하던 것이 전부였는데. 그때만큼 가난이 원망스러웠던 적도 없었다.
그래, 사실 난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는다. 오히려 좋아하는 듯도 싶다. 여인을 남몰래 마음에 품고 있을 때, 혼자 여인과 저 사이에 생긴 아이들을 상상해본 적도 있지 않았던가. 가끔 길가에 작은 아이들이 제 어미와 손을 잡고 총총 걸어가는 걸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 쳐다보기도 한다. 아까 김씨가 자랑같이 하던 딸 얘기를 흘려 들었던 것도 나는 갖지 못하는 아이이니 질투심에 일부러 관심을 안 두려 했던 것이 아닐까. 어머니가 하루 빨리 장가 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재촉할 때마다, 형편도 안 되는데 무슨 장가냐며 돈 벌어서 장가 들 형편만 되면 갈 테니 걱정 말라고 타박 주던 것도 그 마음 한 켠엔 언제나 여인이 있었다.
어머니와 여인이 지나간 바람벽에는 이제 글자들이 떠오른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살아가도록 태어났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내 가슴은 너무도 많이 뜨거운 것으로 호젓한 것으로 사랑으로 슬픔으로 가득 찬다.’
가슴에 울컥 뜨거운 것이 목울대로 차오른다. 마주한 흰 바람벽은 마치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다. 나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떳떳하게 살아오지 않았던가. 가진 돈은 없지만 누군가가 슬퍼하면 함께 울어줄 마음은 갖고 있지 않은가. 쓸쓸하고 외로운 인생이지만 하늘 아래 남 부끄러울 짓은 하지 않았다. 그런 내 앞에, 이번에는 또 이런 글자들이 벽 위로 지나간다. ‘하늘이 이 세상을 내일 적에 그가 가장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하고 외롭고 높고 쓸쓸하게, 그리고 언제나 넘치는 사랑과 슬픔 속에 살도록 만드신 것이다. 초생달과 바구지꽃과 짝새와 당나귀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또 프랑시스 잠과 도연명과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그러하듯이.’
문장여화(文章如畵), 글은 그림과 같다고 했던가. 글이라는 것은 참 신기한 것 같다. 몇 문장 안 되는 짧은 시 하나를 읽었을 뿐인데, 이렇게 생생한 장면이 그림같이 머릿속에 펼쳐지니 말이다.
백석 시인의 ‘흰 바람벽이 있어’라는 시는 평소에도 좋아하던 시였다. 글자를 읽는데도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쓰기와 대학생활’ 강의에서 ‘문장여화’에 대해 배웠을 때 바로 이 시가 떠올랐고, 이번 과제로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들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써 봤다. 하지만 다른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이미지나 장면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모두 제각각일 것이다. 한 편의 시를 통해 수없이 많은 드라마가 그려질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신기하다. 이런 것이 문학의 진정한 매력이 아닐까 싶다.





 분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