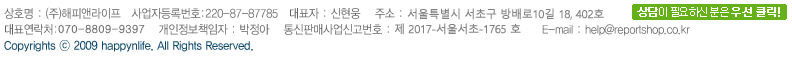[감상문]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
========================================================================
먼저 조혜정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부끄러움과 허탈감이었다. 나는 왜 감추기에만 급급했던 걸까? 왜 그렇게 고민을 해왔던 걸까? 글을 쓰는 부분은 교수님의 책을 읽기 전부터 줄곧 생각해왔던 부분이기도 했다. 어느 샌가 글을 쓰는 것도 나를 꾸미기 위한 포장지로 바뀌고 말았다.
생각해보면 글을 포장해서 쓰는 짓을 하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무렵이었다. 학교에서 독후감 쓰기 대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킬박사와 하이드』를 읽은 나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시나리오 작가를 생각하며 글을 썼다. 그 작가는 지금도 나에게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때는 동경의 대상이었다. 선생님은 그 작가를 몰랐으므로 굉장히 잘 썼다고 칭찬 해주셨고, 우등생이나 올라간다고 여겼던 단상에 올라가서 교장선생님에게 상장을 받았다. 최우수상이었고, 여태껏 받아본적 없는 상이라서 매우 기뻤다.
제대로 된 재주가 없었던 나는 그때부터 자신을 포장하기 시작했다. 글뿐만 아니라 말을 써도 어려운 말을 썼다. 어디서 주워들은 문장이나 표현을 변형시켜서 가져다 썼다. 그러면 내가 가치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짓거리는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더 심각하게 변질되었다. 졸업문집을 읽으면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괴이한 것이었다. 고2, 고3에 가서는 아예 지적인 나를 연출이라도 하려는 듯 다이어리를 가져다가 좋다고 여겨지는 부분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굳이 문학이 아니어도 된다, 심지어 모의고사 언어영역 비문학 부분의 일부도 기록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말들의 뜻, 작품의 진정한 이해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다. 이해할 수 없었던 주제에 말이다. 문학 중에서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좋아했고(그래 봤자 죄와벌이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철학은 실존주의를 좋아했다. 겨우 열여덟, 열아홉이 이해하기엔 무리가 있었는데도 말이다.
지금 곱씹어보면 중2병이라든가, 허세에 찌든 행동이었다. 지금은 이해를 못하고 읽고 싶지 않은 책들이다. 그래도 당시 또래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았다.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우월의식이 매우 달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월의식 속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리포트나 쪽글을 쓸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고, 내가 제일 못 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내 열등감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리포트나 기록들을 살펴보면 나의 글은 없었다. 거기엔 내가 없었다. 꼭 발가벗겨진 기분이다. 포장껍데기는 두꺼워졌고 내 속은 어느 것 하나 달라지지 않았다. 이야기를 쓰는 걸 좋아해도, 남의 눈치를 보고 그의 문체와 나를 비교하고 내가 너무 열등하게 느껴져서 더욱더 포장껍데기를 늘려나갔다. 그 당시 엘리트라고 여겨지는 대학생들도 이런 식의 포장으로 자신을 꾸몄을까 싶었다. 어느 샌가, 그들처럼 글을 써야겠다고 또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텅 비어있는 나를 감추고 싶고 그들 앞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대학생인데도 수준 낮은 게 인식되는 게 부끄러우니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소설가, 시나리오작가)이 되고 싶었고,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초등학교 때는 역사책과 위인전기를 읽었다. 중학교 때는 만화책과 판타지소설 그리고 일본에서 발매하는 게임 번역본을 많이 읽었다. 여기까지는 제법 괜찮았다고 여긴다. 읽고 싶은 것만 읽으면 되니까. 하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렸다.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학교에서 책읽기를 장려를 했는데, 1학년 때 독서 감상문을 쓰라고 일정한 양식의 책을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거기엔 읽고 싶은 것도 있었다. 하지만 싫어하는 책도 있었다. 국어 선생님이 머리를 굴려서 1반부터 8반까지 읽어야 할 책을 짜주시더니 한 달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돌렸다. 여기서부터 내 억압된 책읽기가 시작되었다. 이전에는 읽고 싶은 것만 읽어도 상관없었다. 하지만 싫어도 읽어야 했다. 점수가 걸려있으니까, 상대평가로 전환된 내신에서 점수 1점은 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목숨 줄이었다. 싫어도 읽어야 했던 그 책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파인만씨 농담도 잘하시네』. 물리를 가지고 놀았다는 과학자가 본인의 일생을 기록한 내용이라는 식으로 비뚤어지게 읽은 나였다. 그 때 마감일은 월요일이었는데 책을 산건 전날 밤이었다. 당연히 좋게 감상문을 쓸 리가 없었다. 나에게 돌아온 건 수행평가 최하점이었다. 이후 편독은 더 심해졌고, 그 버릇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지금은 나, 그러니까 대학교 4학년의 나는 해방과 억압의 중간지역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지금의 책 읽기가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생각하진 않는다. 요즘은 여행을 가고 싶은지 유럽지역의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다(독일에 가고 싶은데 독일에 대한 책은 별로 없었다! 아 그리고 스페인, 영국에도 가보고 싶다.). 지난 겨울방학에는 잘생긴 금발의 바리스타 “앨런”과 은행원 언니 “카라”가 달콤하게 연애를 하는 내용을 꿈꿨기 때문에 커피 혹은 바리스타에 대한 책만 읽었다(책이 많이 없던데, 하지만 그 책을 읽으면 커피를 마시고 싶어진다. 아메라카노라든가, 에소프레소라든가.). 정직하게 말하면 전공서적엔 거의 손을 대질 않았지만.... 아무튼 지금의 책 읽기에는 아까도 말했듯이 글속에 내가 없듯이 책 읽기 안에도 내가 없었다. 여기서도 단순하게 읽기만 하고 더는 생각하지 않는 못된 습관이 튀어나오기 때문이었다. 이 이상 생각하는 것? 감히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걸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여겼다. 실제로 답은 없는데, 자꾸만 답을 요구하는 내가 있었다. 수업에서 토론을 해도 나는 입을 다물기만 했다, 아까도 말했듯이 답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일 텐데 자꾸만 남과 비교를 하고 있다. 내가 비판을 해도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책이나 강의나 이런 것에 자꾸만 얽매여 나를 지우고만 있었다.
대학생으로서 읽기는 읽기로만 끝나선 안 되는 것 같다. 잘못 읽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 다만 두렵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들과 똑같이 행동해야 된다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교수님을 따르자면 그 보편주의에 대한 집착이라는 말이 어울리겠다.)이 잘못읽기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잘못 읽어도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도 된다. 마지막 교수님의 말씀은 조금 어렵지만, 아직도 내가 식민지적 지식인의 뒤꽁무니를 쫓아다닌다는 생각이 들게 했다. 나는 발표만 하면 울렁증이 돋고, 토론을 할 때는 입을 다문다. 하지만 발표를 할 때나, 토론을 할 때나, 두렵지만 손을 들고 한마디의 말이라도 해봐야겠다. 행여나 질문이라도... 솔직히 질문을 하는 것도 부끄럽다. 60명의 학생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리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수업시간에 학우님들이 손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 마구 던져도 된다,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무리수라도 던져보자! 정말 쓸데없는 내용은 삼가야겠지만, 보편적인 것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서 좀 다양한 통통튀는 매력을 가진 학우님들이 만들어가는 수업을 기대해보고 싶다. 그 전에 내 떨리는 손에게 교수님을 향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하겠지만 말이다.



![[감상문]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948138-0001.gif)
![[감상문] 탈식민지 시대 지식인의 글 읽기와 삶 읽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9/948138-0002.gif)
 분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