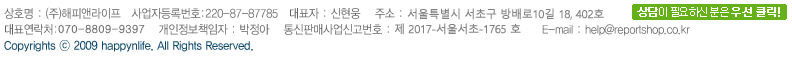1. 언어의 공동(空洞)
2. 몸의 기관과 감각
지면 속에서 빠져나오는 언어
천천히 지면을 걸어 다닌다.
언어가 허공에 입을 천천히 벌리며
‘나는 내 세계의 바깥에 너희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너희들은 나를 가지고 춤을 추고 세계를 이야기하지만 너희들의 세계는 내가 보는 너희들의 세계와 다르지 않아 우리는 모두 인형들이고 너희들이 들고 있는 인형 역시 나일 것이지만 너희들이라는 인형을 들고 있는 유령 역시 바로 나이지 너희들이 나를 들고 있을 때 나는 너희가 유령처럼 느껴지고 너희가 나를 유령이라 발음할 때 너희는 나라는 유령이 들고 있는 인형일 테니까 나는 지금 우리가 머무는 세계의 유령을 들고 있는 인형의 웃음이지.’
- 프롤로그 부분(강조는 원문)
『기담』은 “관념의 영역 내에서만 무대화되는 불가능한 극으로서 언어 그 자체를 주인공으로 표상”하고 있다. 강계숙, 「프랑켄슈타인-어(語)의 발생학」, 『기담』, 문학과 지성사, 제2판, 2009, 163면.
극의 연출을 맡은 김경주는 시인 자신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어 그 삶의 ‘배후’일 수밖에 없는 언어를 ‘배우’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재현될 수 없는 극이지만, 시인이 극의 형태를 취한 데에는 극의 표현 방법이 “언어를 상대”하기에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연극은 공연이란 형식을 통하여 사물과 세상을 가두지 않고 새롭게 존재하는 가능조건으로서 존재하는 예술이다. 사물과 세상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이란 형식 안에 들어옴으로써 사물과 세상은 비로소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새롭게 획득하게 된다. 안치운, 「연극과 몸-말에서 글로, 글에서 몸으로」,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몸의 인문학적 조명』, 월인, 2005, 68면 참조.
극을 통해 시인은 언어가 “방에 앉아 이상한 줄을 토하”도록(「기담」), 춤을 추며 “우리가 모르는 수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시”가 되도록 내버려두며 “눈부신 문자의 활공”(「물새의 초경」)을 지켜본다.
극은 ‘사이’ 즉, 빈 공간을 허용하여 거리를 확보한다. 별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세상에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별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기 때문’(「곤조GONJO (No.5)」)인 것처럼, 이 거리가 시인으로 하여금 언어를 바라볼 수 있게 하며, 인형인 언어가 ‘너’라고 부름으로써 시인을 객체화할 수 있게 한다. 시인이 언어를 대상 또는 도구로 시를 쓰는 사람이라고 할 때, 언어가 시인을 대상화한다는 일종의 지위 역전은 언어의 존재를 획득하기 위한 낯설고 신선한 발상이다. 게다가 언어는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인간을 당황케 한다. 인형은 각각 구별된 다른 개체일 것 같은 나, 나의 세계, 너희들, 인형, 유령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어느새 인형은 우리에게 유령으로 다가온다. 유령은 있으면서 없기 때문에 무섭다. 우리의 삶은 있음/없음, 존재/부재 같은 2항 대립 체계인데, 이런 체계가 파괴될 때 사회는 혼란에 빠진다. 유령은 있음/없음의 질서를 파괴한다. 문학, 특히 시 속에는 안 되는 게 없으니 글쓰기 역시 유령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문학에 빠지는 것은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승훈, 『해체시론』, 새미, 1998, 207-208면 참조.
언어가 인간의 모습을 ‘재현’하면서 인간을 이러한 발상을 가능케 하는 ‘사이’는 “공(空)을 나르는 구름의 필체”(「자두는 무슨 힘으로 외풍을 막는가」)로 “내 삶의 전 자원인 간격에 위성이 돌”듯이(「(오름)8½ 팔과 이분의 일」) 『기담』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
김경주 시인은 이렇게 모호하고 불안한 사이 속에서 세계의 틈과 균열을 보며, 기존 언어 체계에 흠집을 낸다. 시가 재미있는 것은 이런 틈과 흠집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어이다. 세계의 틈을 본다는 것도 결국은 언어를 매개로 한다. 세계란 말이 그렇듯이 세계란 언어에 지나지 않고, 그것도 매우 모호한, 추상적인 언어로 존재한다. 시쓰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우리를 구속하는 세계인 언어의 체계에 상처를 내는 일, 아니 그 체계의 틈을 파고 들어가는 일이다. 세계의 틈을 본다는 것은 언어의 틈을 본다는 것이며, 쉽게 말하면 재현 체계로서의 언어에 흠집을 내는 일과 통한다. Ibid, 153-154면 참조.
그래



![[문학] 김경주 `기담`-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1.gif)
![[문학] 김경주 `기담`-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2.gif)
![[문학] 김경주 `기담`-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3.gif)
![[문학] 김경주 `기담`-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4.gif)
![[문학] 김경주 `기담`-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5.gif)
![[문학] 김경주 `기담`-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6.gif)
![[문학] 김경주 `기담`-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7.gif)
![[문학] 김경주 `기담`-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9/388274-0008.gif)
 분야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