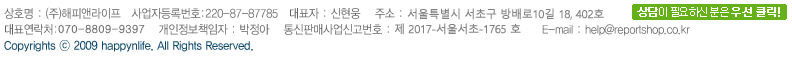[영화감상문] 영화 소녀를 보고 나서
시골 학교로 전학 온 서울학생 윤수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해원에게 묘하게 끌린다. 밤에 혼자 호숫가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게 유일한 낙인 해원이는 정신지체 아버지와 둘이 산다.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은 이들 부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지만 윤수는 신경 쓰지 않고 해원이와 밤마다 자전거와 스케이트를 타며 마음을 나눈다. 그러던 어느 날, 윤수는 해원이의 수상한 행동을 보게 되고 다음 날 해원이의 아버지가 팔이 잘려 죽은 시체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윤수 또한 다른 사람들처럼 해원에게 거리를 두게 되지만 둘은 다시 화해를 한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해원에게 주는 수모를 참지 못한 윤수는 마을 이장과 의사를 죽이고 둘은 도망친다.
얼핏 보면 식상할 수 있는 소재의 이야기다. 상처받은 두 소년, 소녀가 사랑으로 치유해 나가는 이야기 말이다. 그렇지만 이 영화는 사랑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지도, 진부한 사랑 이야기에 중점을 두지도 않았다. 나는 이 영화가 스릴 넘치고 흥미로웠지만, 그것보다도 나름의 깊이를 가진 영화라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다. 우선, 영화는 마을에서 발생한 돼지 구제역을 극의 주된 줄거리와 잘 맞물려가면서 상징성을 나타냈다. 돼지들이 산 채로 매장되는 것은 아마 사람들의 무수한 소문들에 의해서 매장당하는 해원이와 아버지, 그리고 윤수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중간 중간에 윤수는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 이명을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돼지가 생매장 당할 때 내는 소리와 사람이 지르는 비명이 섞인 것 같은 소리다. 아마도 감독은 어느 것이 진실일지 모를 소문에 의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매장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잘린 해원 아버지의 팔이 돼지시체 사이에서 발견된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뭔가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를 때, 나는 아이들이 죽인 시체를 보고 소리 지르는 것일 줄 알았는데 돼지들의 시체를 보고 소리 지른 것임을 알았을 때도 사람과 돼지가 중첩된 이미지가 떠올랐었다.
나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윤수와 해원이 사랑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장면인데 윤수의 부모님 때문에 혼자 어두운 길로 돌아가는 해원의 뒷모습이 그렇게 쓸쓸해 보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분명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몸을 나눈 사이였지만 여전히 나약하고 외로운 해원이가 느껴졌었다. 그때 나는 윤수가 해원이의 빈 마음을 다 채워주지는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음이 아팠다. 두 번째로는 이장과 의사를 죽이고 열심히 언 땅을 파는 윤수에게 얼음을 집어서 볼에 대주는 장면이었다. 보통은 온기를 전하기 위해 접촉을 하지만 해원이는 윤수에게 차가운 얼음으로 위로를 하듯이 볼에 대주었다. 이것은 이들이 서로의 상처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치유해간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장면이다. 이 둘은 도망 다니다 결국엔 다시 그 호숫가로 돌아와서 둘 다 스케이트를 탄다. 호숫가는 녹아서 갈라지려고 소리를 내지만 이 둘은 슬픈 미소를 띠며 자유롭게 빙판을 돌고, 달린다. 얼음이 깨질 것을 알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둘이 자살하는 것에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모습이 슬프면서도 아름답게 느껴졌었다. 인간의 추악한 면을 스릴러물로 이끌어간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소년과 소녀가 죽은 것인지, 산 것인지 알 수 없는 열린 결말로 설정하니깐 판타지적인 느낌이 났다. 마치 호수에 잠긴 슬픈 사랑의 전설이라고나 할까. 영화는 10대들의 이야기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어두움을 신비롭고 슬프게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좋았던 부분이 많았던 영화지만 너무 정형화되고 유치한 것들도 있었다. 예를 들면 윤수가 월식을 설명하는 장면이나 해원이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장면은 차라리 빼 버려도 좋을 만큼 너무 인터넷 소설처럼 틀에 박히고 오글거렸다. 또 심장에도 굳은 살이 배겼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해원이의 대사에서 ‘내 이름은 김삼순’의 삼순이가 심장이 딱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대사가 생각났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선하게 바꿨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점 빼고는 전체적으로 정말 재미있었고 여운이 남는 영화였다.
해원이는 어둡고 차가운 이미지지만, 따뜻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스스로 얼음 속에 들어간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극 중 해원의 행동이나 비밀스러운 면들은 납득이 잘 갔지만, 윤수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허락하는 장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끊임없이 이장 할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던 그 충격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먼저 스스로 단추를 푸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마지막 이장에게 의사를 죽인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당돌하게 치마를 먼저 올리던 심리라면 모를까.
윤수는 이 영화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인물 그 자체에 담고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GV 내용에서도 나오지만 인간의 양면성을 가장 잘 드러낸 인물이다. 해원에게 있어서 바깥사람이기도 하지만, 해원에게 속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따뜻한 이미지 속에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는 잔혹성도 갖고 있는 인물이다. 감독이 말했듯이 10대라는 설정 때문에 이런 것 양면적인 것들이 무리 없이 표현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영화감상문] 영화 소녀를 보고 나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2/941449-0001.gif)
![[영화감상문] 영화 소녀를 보고 나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942/941449-0002.gif)
 분야
분야